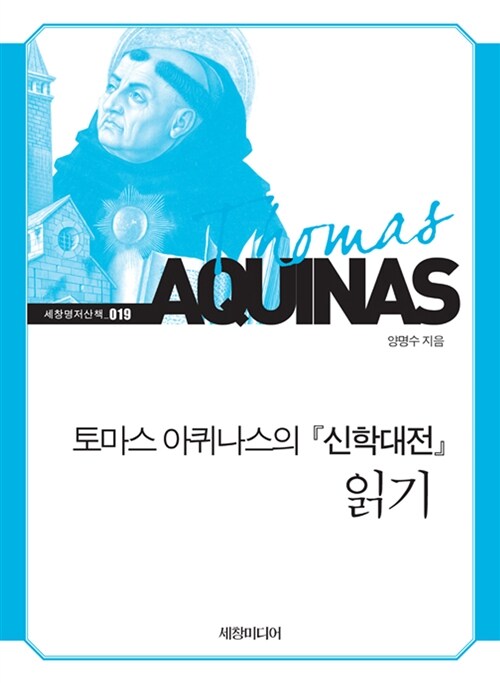
신학대전을 2회 읽었다. 정확히는 신학대전을 다른 사람이 요약한 책을 읽었다. 신학대전 원본은 신약, 구약성서의 글자 수를 모두 풀어놓은 것의 3배 정도 될 길이라고 한다. 너무 양이 방대하기에 요약내용을 읽는 것이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었다. 하지만 이 책은 의미의 전달이 대체적으로 분절화되어있고 신학대전이 정말 이런 내용인지 의문일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서 논리적 비약이 들어있다. 다만 아퀴나스가 살던 시대가 1200년대 중세 한가운데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신학에 대한 고찰을 자연이성으로 풀이하려고 했다는 파격적인 시도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며, 이 핵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전반적인 내용을 톱아보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 책이었다. 책을 읽고 든 생각을 3가지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800년의 배경지식 차이가 나는 고전을 읽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해 주었다.
오랫동안 인류에게 사랑받는 고전은 왜 읽히는 걸까. 현대 과학의 흐름 속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엎어지는 패러다임이 허다한데 수십, 수백, 심지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줄도 모르는 수천 년 전의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한 말을 왜 우리는 이따금씩 귀 기울이곤 하는 걸까. 역자가 줄여 쓴 신학대전 속 아퀴나스는 무척 결정론적인 시각의 또 목적론적인 시각의 인물이어서 사람은 원래 그렇다 하느님은 원래 그렇다 라는 식의 기저를 바탕으로 사상누각의 전개를 하고 있었다. 읽어내려가면서 부분적으로 맞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상 순환논법 등의 논리적 오류를 일삼고 있었고 생각의 비약도 너무 많았다. 한 문장 읽어내려갈 때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기는데 어느 것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의 말을 토대로 스스로 답변하려고 해도 답변되지 않은 명제로 급한불을 끄듯이 답변이 되어 맞으면서 맞지 않는 애매한 상황에 자주 빠지게 되었다. 결국 읽기 싫어도 끝은 봐야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읽어 내려갔다.
모든 고전은 땅에서 발굴해낸 유물과 같이 손상되어있고 흙이 묻어있다. 어느 누가 도덕경에서 물의 원리를 찾으려 하겠으며 어느 누가 오디세이를 읽고 천문학을 공부하려 하고 어느 누가 자본론을 읽고 경제학을 배웠다 하겠는가. 특히 신학에서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근거 없는 해답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고전을 읽을 때는 우리의 배경지식마저 작가의 시대로 돌아가야 더 잘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은 절대 그럴 리 없는 사실들이라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800년 전의 신학자다. 나에게 진리를 깨우쳐줄 좋은 고전을 만났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고전의 흙을 털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그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는 자연 이성적인 신 존재의 접근이 그런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제1원리, 그것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행동이며 하느님 그 자체라고 하였다. 앞으로 밝혀지는 그 무엇이든 세상 모든 것에는 앞서 일어난 원인이 있고 그 촉발이 나중에 무엇이 되건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미지수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논리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는 것.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다. 그 외 이 책에서 제대로 답변받은 것은 없고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암흑기를 살 고 있었는지만 엿볼 수 있었다.
중세 기독교 사회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느꼈다.
아퀴나스가 한 말만 들었지만 이미 그 당시 유럽의 교회는 인간을 하느님을 위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이어서 인간 외의 다른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인간보다 하찮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믿음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기에 의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죄악이었다.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원죄 때문이며 이를 사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죄 사함뿐이었다. 더 논할 게 없었다. 합당한 설명 없이 인간은 원래, 하느님은 원래라는 식의 믿음 강요가 만연했고 사실상 그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그거면 충분했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은 대충 그러려니 믿고 그냥 오늘 먹을 밥을 구하면 그걸로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믿음이든 뭐든 자신이 가치 있어지는 무언가만 있다면 시시콜콜한 본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사실 현대의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하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인간은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이 광활한 우주 속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찰나보다 짧은 순간을 반짝였다 사라지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시각이 21세기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걸 타파하거나 현실에 적응시킬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불행한 것은 그 옛날 옛적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 치고 믿음을 강요하고 허튼곳에 돈을 쏟고 특정 사람들을 혐오하는데 잘못된 신앙심이 많이 쓰이고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현대 기독교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서 역사 속 과학적 증명이 차례차례 무너뜨려온 성서의 거짓말 속에서도 튼튼하게 살아있다. 물론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 사실을 매도하고 그저 다시 믿음으로 회귀하기를 소리치는 눈먼 자들도 있지만, 현대 과학을 받아들이고 성서를 사실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사실들 속에서 종교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탐색하는 손길들도 많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내팽개쳐두는 것도 답이 아니기에 그들도 언젠가는 끝내 설득해내야 할 순간이 찾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시선이 아닌 그 옛날 중세시대의 사람들처럼 대하는 게 더 그들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와인이야기 (더 아톰 까베르네 소비뇽, 미국) (광고아님) (0) | 2022.07.23 |
|---|---|
| 와인이야기 (레 자멜 까베르네 소비뇽, 프랑스) (광고아님) (0) | 2022.07.15 |
| 정보 블로그의 본질은 기자와 같다 (0) | 2022.06.27 |
| 내 삶의 원리原理 The principle of my life (0) | 2022.06.20 |
| On the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0) | 2022.06.18 |